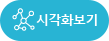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5801853 |
|---|---|
| 한자 | -鎭安望馬耳山-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문학 |
| 유형 | 작품/문학 작품 |
| 지역 | 전라북도 진안군 |
| 시대 | 조선/조선 전기 |
| 집필자 | 박순철 |
| 저자 생년 시기/일시 | 1431년 - 김종직 출생 |
|---|---|
| 저자 몰년 시기/일시 | 1492년 - 김종직 사망 |
| 배경 지역 | 마이산 -
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
|
| 성격 | 한시 |
| 작가 | 김종직(金宗直) |
[정의]
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을 바라보고 조선 전기 김종직(金宗直)이 지은 한시.
[개설]
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을 읊은 시 「진안망마이산」은 김종직(金宗直)이 지은 것이다. 김종직[1431~1492]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관(孝盥)·계온(季昷), 호는 점필재(佔畢齋)이다. 문장이 뛰어나 많은 시문과 일기를 남겼다. 저서로는 『점필재집』, 『청구풍아(靑丘風雅)』 등이 있다.
[구성]
「진안망마이산」 앞의 4구는 “기이한 봉우리 하늘 밖에서 떨어졌는데”, “높이는 몇 천 길이나 되는지”라고 하여 진안에서 바라본 마이산의 웅장한 모습을 묘사하였고, 5~10구는 마이산 명칭의 유래에 대해 임금의 돌아보심을 힘입어 저속한 이름을 버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만년에 전하게 되었음을 시구에 드러냈으며, 19~26구에서는 자신이 비록 마이산 지척에 왔지만 다리가 불편해 올라가지 못하여 속세에서 벗어나 신선과 만나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.
[내용]
1. 진안망마이산(鎭安望馬耳山) [진안에서 마이산을 바라보다]
천외락기봉(天外落奇峯) [기이한 봉우리 하늘 밖에서 떨어졌는데]
쌍첨여마이(雙尖如馬耳) [쭈뼛한 두 봉이 말의 귀와 같구나]
부지기천인(不知幾千仞) [높이는 몇 천 길이나 되는지]
정정연무리(亭亭烟霧裏) [연기와 안개 속에 우뚝하도다]
우몽중동고(偶蒙重瞳顧) [우연히 임금의 돌아보심을 힘입어]
가명전만禩(佳名傳萬禩) [아름다운 이름이 만년에 전하게 되었네]
용출여부모(湧出與父母) [용출봉이다 부봉 모봉이라고 한]
전칭진비리(前稱眞鄙俚) [예전 명칭은 참으로 저속하였네]
중원역유지(中原亦有之) [중원에도 또한 이 이름이 있는데]
명실당상의(名實倘相擬) [이름과 실제가 서로 비슷하다오]
진재교막궁(眞宰巧莫窮) [조물주의 기교함은 끝이 없으니]
영회홍몽시(永懷鴻濛始) [길이 혼돈상태의 처음을 생각하네]
아래추우여(我來秋雨餘) [가을비 내린 뒤에 내 여기 오니]
청홍착여기(靑紅錯如綺) [푸르고 붉은 빛이 비단 무늬 같은데]
탁탁춘순자(濯濯春筍姿) [아름다운 봄 죽순 같은 자태를]
상외불상의(相偎不相倚) [서로 사랑할 뿐 기댈 수는 없구나]
요첨수불도(遙瞻首不掉) [멀리 바라보며 고개 돌리지 않으니]
문호종야䦱(門戶終夜䦱) [문은 밤새도록 열어두었도다]
괴무제승구(愧無濟勝具) [건강한 다리를 지니지 못하여]
지척난력시(咫尺難歷視) [지척도 두루 보지 못함이 부끄러워라]
안득록옥장(安得綠玉杖) [어떻게 하면 대지팡이를 짚고]
고보탈니재(高步脫泥滓) [높이 올라 더러운 속세를 벗어나서]
신숙쇄석암(信宿碎石庵) [쇄암사에서 이틀밤을 지내고]
상읍봉정수(上挹峯頂水) [꼭대기에 올라 샘물을 떠가지고]
청동공상략(靑童共商略) [선동과 함께 상의하여]
일복방촌비(一服方寸匕) [방촌비의 약을 한번 먹어 볼꼬]
싯구 중 8구의 “예전 명칭은 참으로 저속하였네”라는 구절은 진안에 있는 마이산(馬耳山)이 두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명칭은 용출봉(湧出峯)이었고, 또 동쪽에 있는 것을 부봉(父峯), 서쪽에 있는 것을 모봉(母峯)이라고 했던 것인데, 조선 태종(太宗)이 일찍이 남쪽에 행행하여 이 산 아래 이르러서 관원(官員)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, 그 모양이 말의 두 귀와 같다 하여 명칭을 마이산으로 고쳐 주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. 또한 26구의 “방촌비”는 사방 한 치[일촌(一寸)]쯤 되는 약숟가락을 말한다.
[특징]
마이산의 형상을 “쭈뼛한 두 봉이 말의 귀와 같구나”, “아름다운 봄 죽순 같은 자태” 등의 비유를 들어서 잘 표현하였다.
[의의와 평가]
마이산의 웅장한 기상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였고, 또한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다. 이 시는 김종직의 웅혼한 시풍을 잘 드러낸 시라고 할 수 있다.